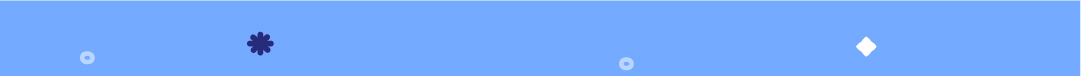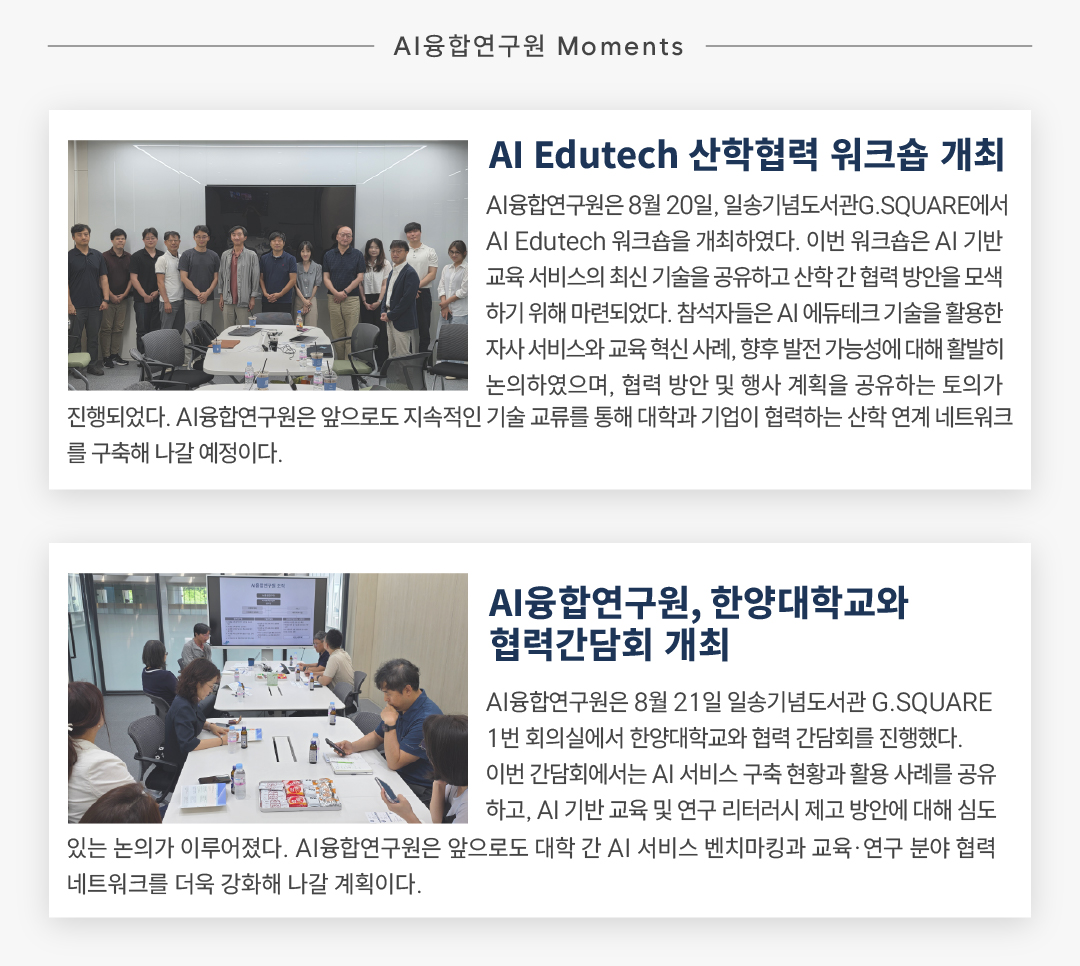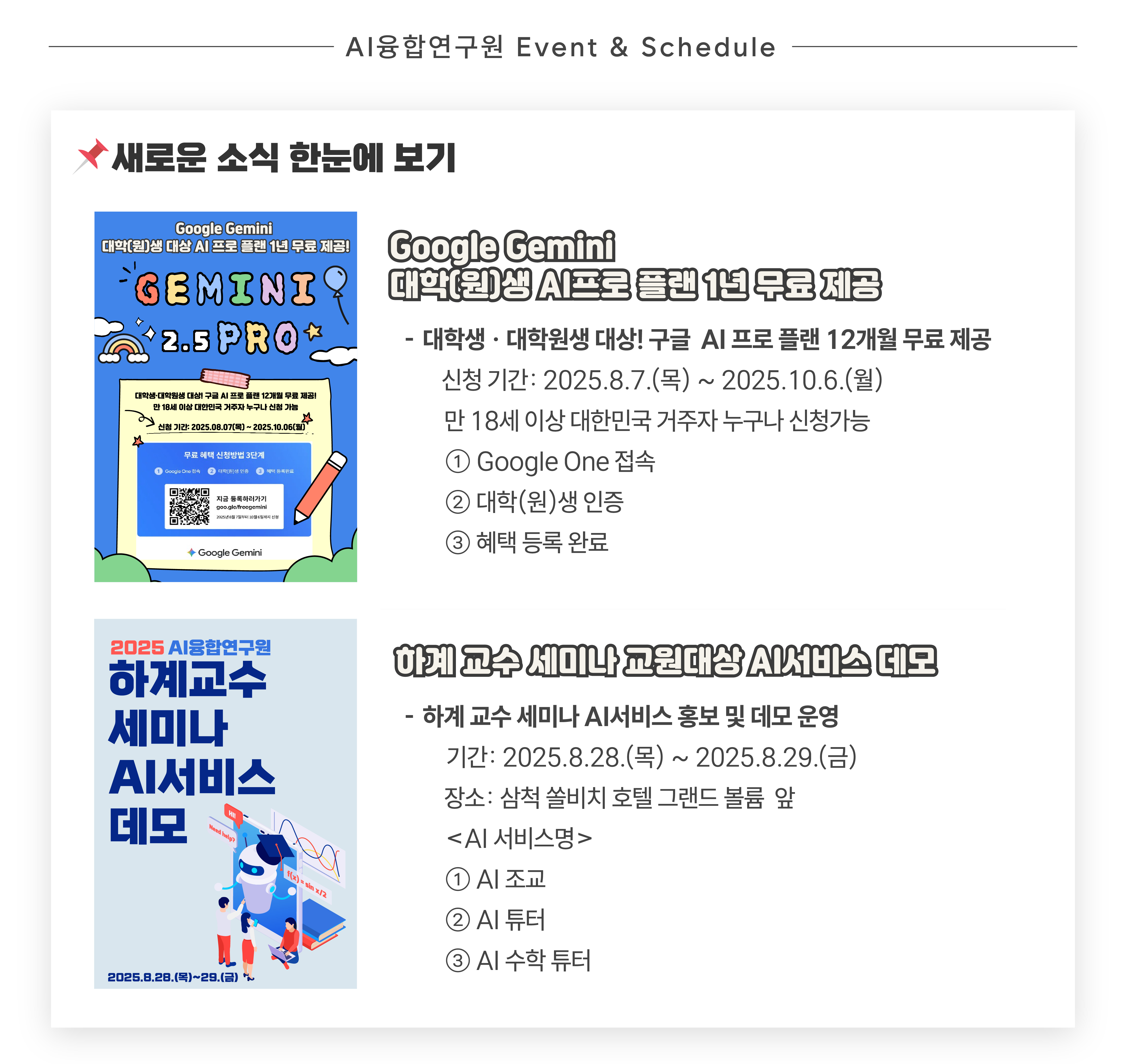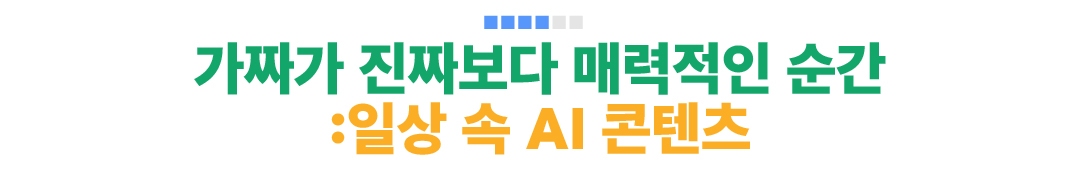|
|
게시글 리스트
-

NO. 14
AI융합연구원 뉴스레터 test 게시물 새글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9.02
- 조회수20
- 첨부파일
-

NO. 13
제13호, "사고 모델에서 옴니 모델로_생각하는 AI,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AI" 새글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8.25
- 조회수121
- 첨부파일
-

NO. 12
제12호, "AI 튜터는 어떻게 학습을 바꾸는가?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8.11
- 조회수149
- 첨부파일
-

NO. 11
제11호, "국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AI, 교육의 미래는?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7.28
- 조회수156
- 첨부파일
-

NO. 10
제10호, "GPT-5, 도구를 넘어, 나를 학습하는 '통합 지능 인프라'로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7.14
- 조회수221
- 첨부파일
-

NO. 9
제9호, "내가 쓴 글이 왜 기억이 안 나지?": ChatGPT 시대의 학습과 뇌의 책임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6.30
- 조회수271
- 첨부파일
-

NO. 8
제8호, "AGI는 이미 시작됐다?-샘 알트먼의 선언을 보며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6.16
- 조회수444
- 첨부파일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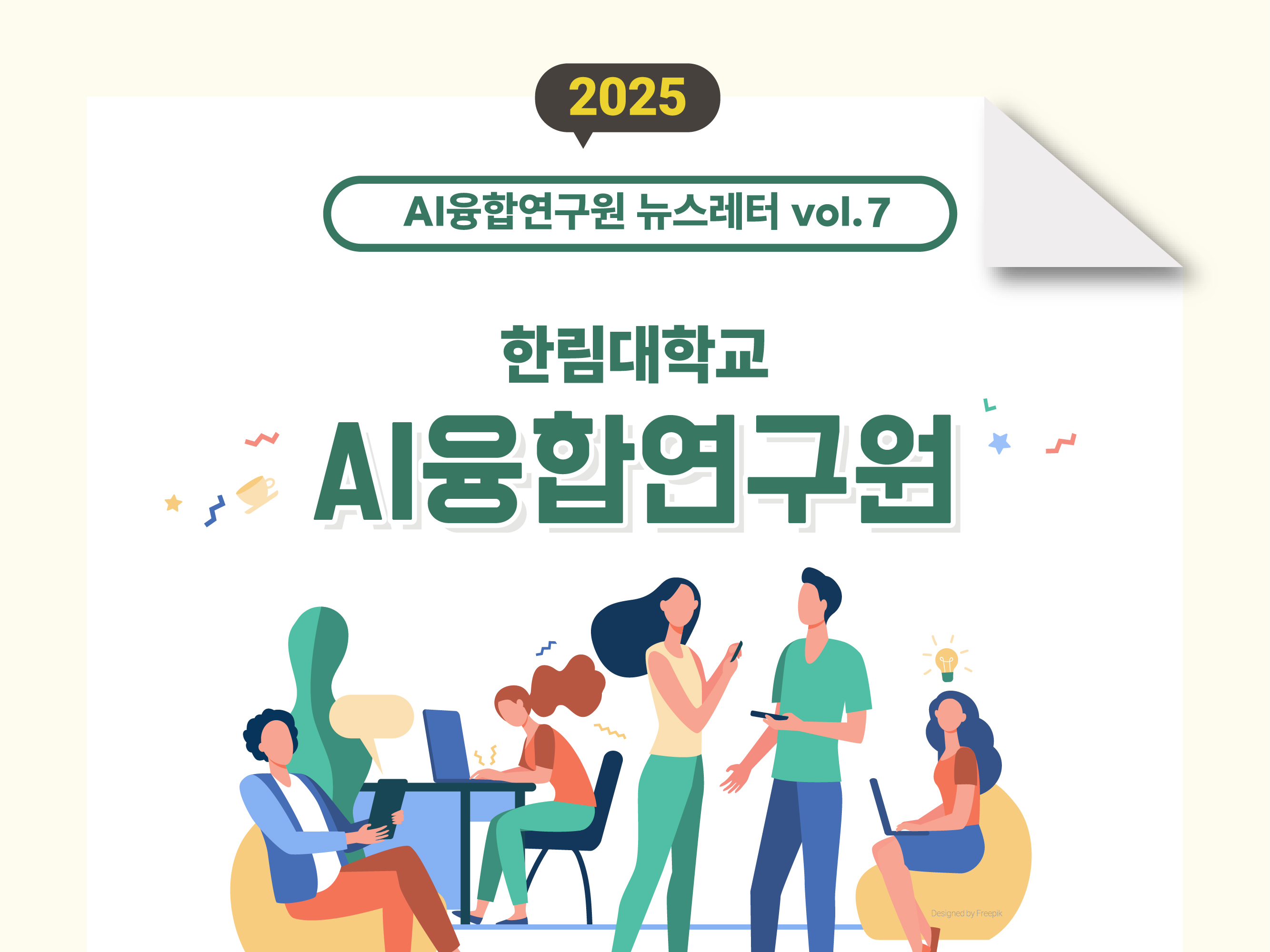
NO. 7
제7호, "외부 정답 없이 배우는 AI - 스스로 확신하며 추론하는 INTUITOR의 실험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6.02
- 조회수349
- 첨부파일
-

NO. 6
제6호, "AI가 만든 알고리즘, 인간을 뛰어넘다 - AlphaEvolve가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의 방식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5.19
- 조회수349
- 첨부파일
-

NO. 5
제5호, "스트리밍 사이언스: AI가 변화시키는 미디어 스트리밍 산업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5.07
- 조회수324
- 첨부파일
-

NO. 4
제4호, "코딩은 끝났다? "Vibe Coding"과 GPT-4.1이 말하는 개발의 미래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4.21
- 조회수324
- 첨부파일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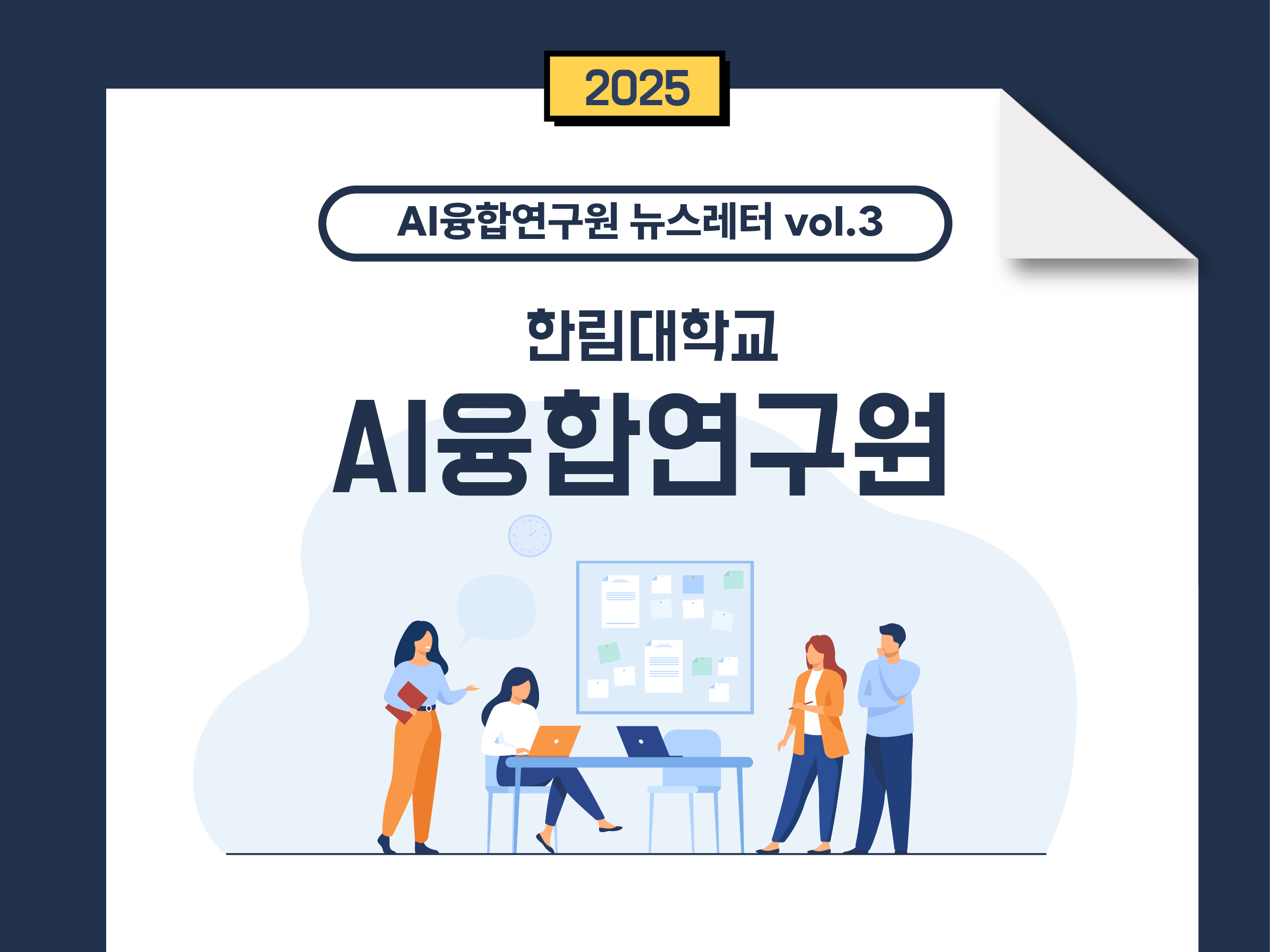
NO. 3
제3호, "감성의 AI, 감정의 기술-'지브리화' 열풍이 말해주는 것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4.07
- 조회수327
- 첨부파일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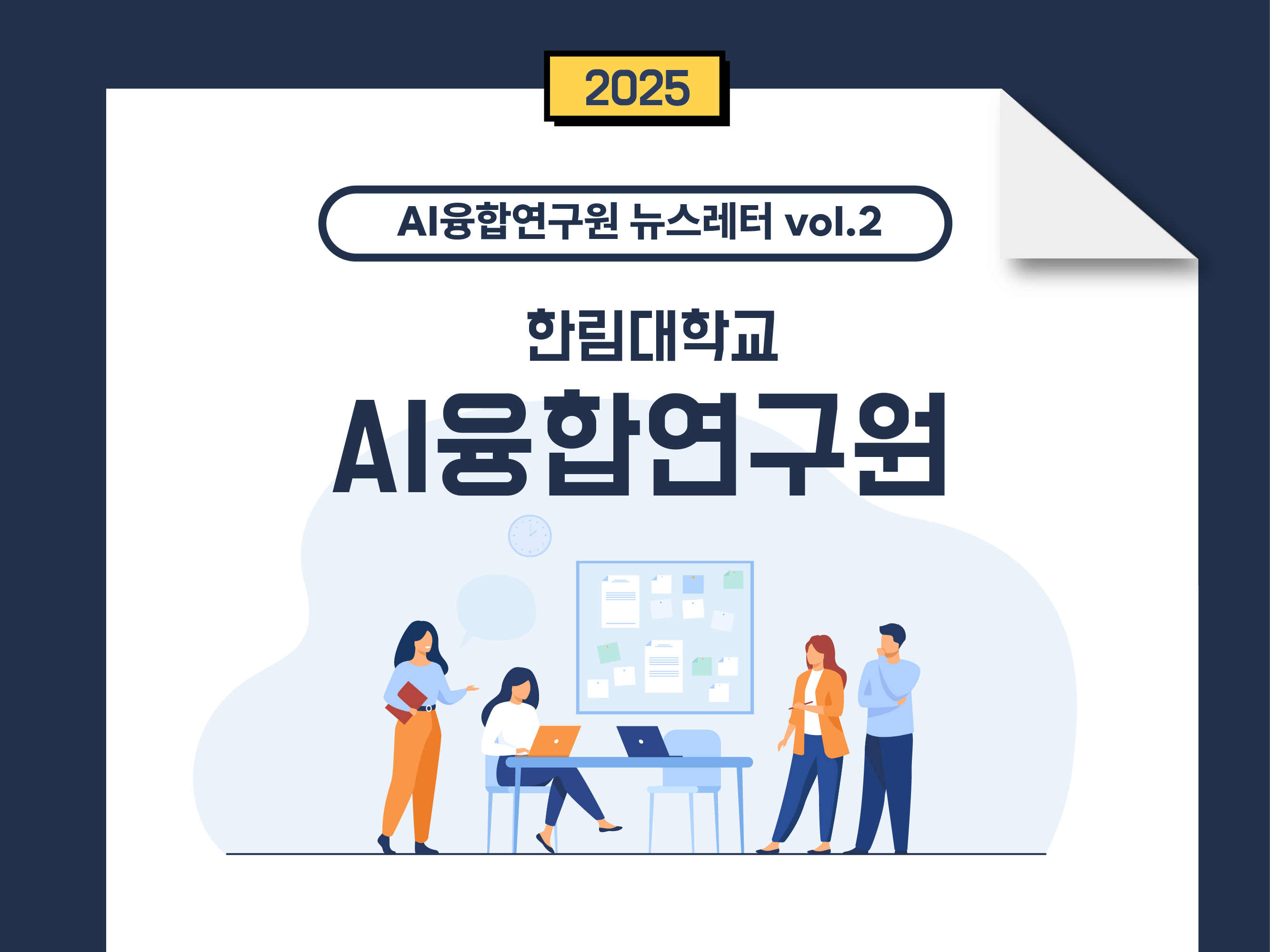
NO. 2
제2호, "숨가쁘게 달려가는 AI 혁신의 흐름속에서-Gemma 3가 던지는 의미"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3.24
- 조회수306
- 첨부파일
-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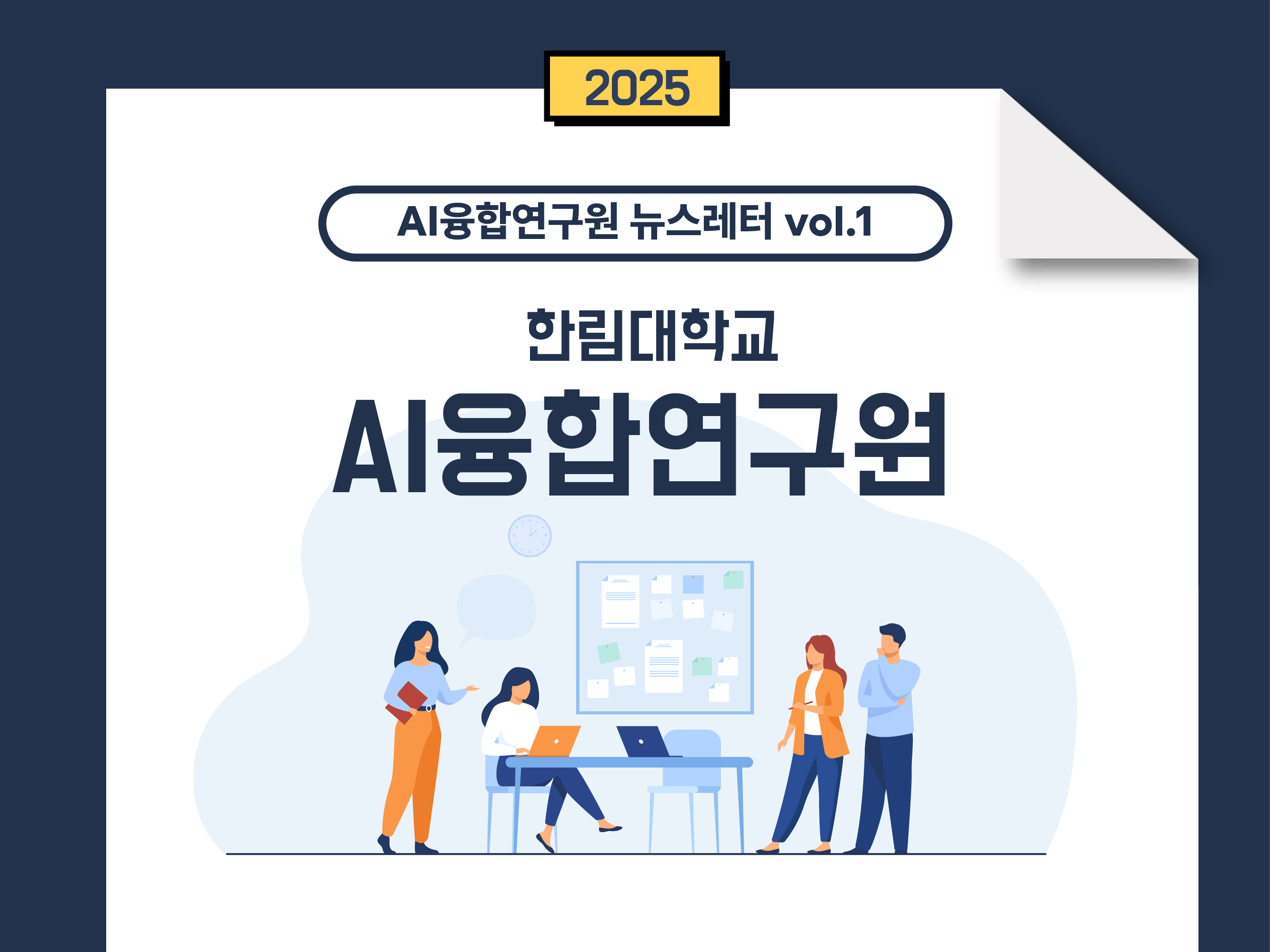
NO. 1
AI융합연구원 뉴스레터 제1호, 2025.03.10.월- 작성자AI융합연구원
- 등록일2025.03.10
- 조회수318
- 첨부파일